kommunikative rationalität

"언어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도구다."
이것이 20세기 후반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선배들에게 던진 메시지였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계몽의 이성을 도구적 지배의 논리로 비판하며 절망에 빠졌을 때, 하버마스는 오히려 언어 속에서 해방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40년 뒤, 그의 강의실에서 공부한 한 미국인 철학도가 실리콘밸리로 돌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 분석 회사를 만들게 된다. 알렉스 카프, Palantir Technologies의 CEO다.
이 둘의 만남은 현대 기술 철학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 중 하나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한 민주적 해방을 꿈꾸던 철학자와, 그 이론을 배우고도 감시와 데이터 분석의 제국을 건설한 제자.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21세기 기술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1981년, 하버마스는 그의 필생의 역작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출간했다. 2권 1,2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저작은 사회과학의 기초를 '노동'에서 '언어'로 옮기는 시도였다. 마르크스가 노동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이해했다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회이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타당성 주장을 동시에 제기한다.
- 첫째, 객관적 세계에 대한 진리 주장(truth claim).
- 둘째,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정당성 주장(rightness claim).
- 셋째, 주관적 경험에 대한 진실성 주장(sincerity claim).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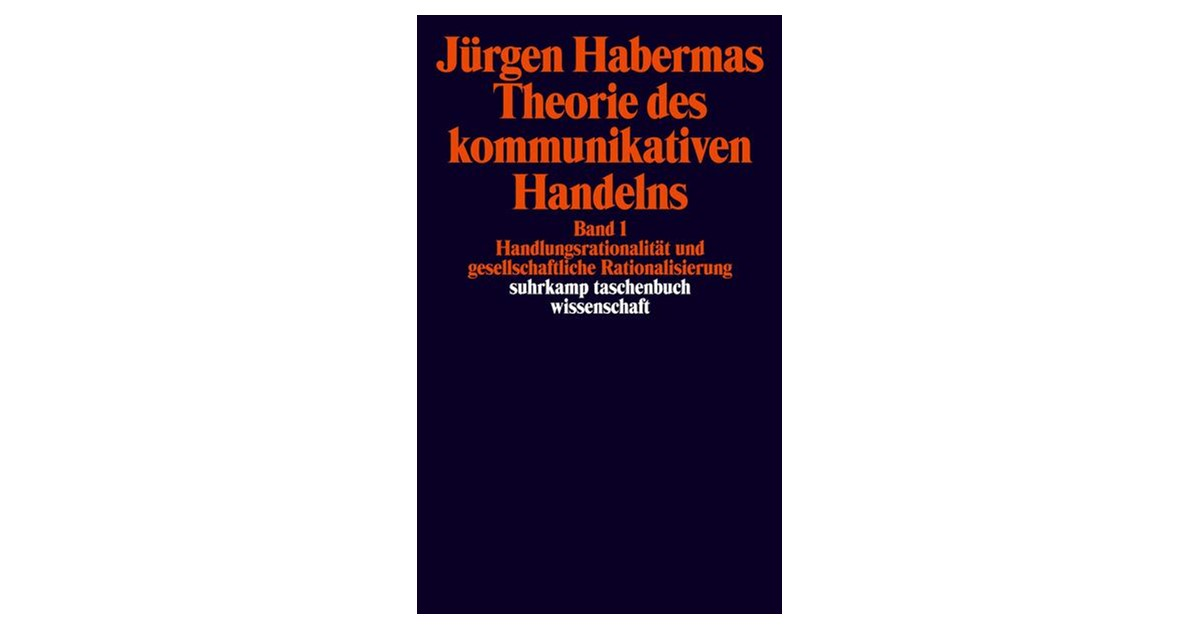
하버마스는 이를 통해 막스 베버가 제시한 도구적 합리성의 일방적 지배를 극복하고자 했다. 베버는 근대화를 '합리화'의 과정으로 보았지만, 그것은 결국 관료제와 자본주의라는 '쇠창살 감옥'으로 귀결되었다. 하버마스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다. 합리성에는 도구적 합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행위는 전략적 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략적 행위는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합리적 행위다. 반면 의사소통 행위는 타인과의 상호 이해와 합의를 지향하는 행위다. 하버마스는 사회통합이 단순히 권력이나 돈이라는 '조정 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Lebenswelt and System
하버마스 이론의 또 다른 핵심은 '생활세계'(Lebenswelt)와 '체계'(System)의 구분이다. 이 개념은 후설의 현상학에서 빌려왔지만, 하버마스는 이를 사회이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생활세계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펼쳐지는 배경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적 전통, 사회적 규범, 개인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문화적 재생산, 사회적 통합, 그리고 사회화. 생활세계에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하며, 사람들은 상호 이해를 통해 행위를 조정한다.
반면 체계는 경제와 국가 행정으로 대표되는 기능적 하위체계다. 여기서는 돈과 권력이라는 '조정 매체'가 작동한다. 시장에서 우리는 화폐를 통해 교환하고, 행정체계에서는 권력을 통해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형성된다. 체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아니라 목적합리성, 즉 효율성과 효과성의 논리로 작동한다.
문제는 근대 사회에서 체계가 점점 더 비대해지면서 생활세계를 '식민화'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를 현대 사회의 근본적 병리로 진단한다. 경제의 논리가 가족 관계를 침투하고, 행정의 논리가 교육과 문화를 장악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해야 할 영역에 도구적 합리성이 침입하면서, 사람들은 의미의 상실, 아노미, 소외를 경험한다.
하버마스가 들었던 유명한 예시가 있다. 독일의 한 건설 현장에서 나이 든 노동자가 새로 온 젊은 동료에게 "맥주 좀 사와, 빨리 다녀와"라고 말한다. 이 단순한 지시 속에는 수많은 생활세계의 전제가 깔려 있다.
- 독일 건설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에 맥주를 마신다는 문화
- 후배가 심부름을 한다는 위계
- 근처에 맥주를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공간적 지식 등등.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공유되기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이 젊은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여서 건강보험이 없고,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복지국가에서는 갑자기 체계의 수많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개입한다.
노동법, 사회보험법, 이민법 등 체계의 논리가 이 단순한 생활세계의 상호작용을 침투한다. 생활세계가 법률화되는 순간이다. 하버마스는 이것이 복지국가의 역설이라고 본다. 복지국가는 시민들을 보호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활세계를 관료제의 논리로 식민화한다. 평소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이 이제는 체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순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Alexander Caedmon Karp
1967년 뉴욕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카프(Alexander Caedmon Karp)는 독특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다. 카프는 펜실베이니아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그 후 스탠포드에서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지만, 그의 지적 갈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그는 독일로 향했다. 목적지는 프랑크푸르트였다.프랑크푸르트 대학은 특별한 곳이다. 1950년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가 재건한 사회연구소가 있는 곳,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본산이다. 카프가 이곳에 온 이유는 명확했다. 하버마스 밑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설과 현실은 달랐다. 업계 전설에 따르면 카프가 하버마스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카프의 2002년 박사논문 "Aggression in der Lebenswelt: Die Erweiterung des Parsonsschen Konzepts der Aggression durch die Beschreibung des Zusammenhangs von Jargon, Aggression und Kultur"(생활세계에서의 공격성: 전문용어, 공격성, 문화의 연관성 기술을 통한 파슨스적 공격성 개념의 확장)의 지도교수는 Karola Brede 교수였다.이 불일치는 의미심장하다. 카프와 하버마스 사이에 어떤 결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아마도 카프의 연구 방향이 하버마스의 해방적 프로젝트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127페이지의 간결하지만 밀도 높은 독일어로 쓰인 카프의 박사논문은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개념을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카프는 아도르노의 『전문용어의 진정성』에서 영감을 받아, 언어, 특히 전문용어(Jargon)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공격성을 통합하고 관리하는지를 분석한다.
카프의 논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명백히 자기모순적인 진술들은 한 개인에게 자신의 문화적 환경의 규범적 질서에 형식적으로 헌신하면서, 동시에 이 질서의 규칙을 위반하는 금기된 욕망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하버마스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상호 이해를 지향한다고 보았다. 반면 카프는 프로이트를 따라, 언어 속에 억압된 공격성과 파괴 충동이 작동한다고 본다. 전문용어는 이러한 공격성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승화'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카프는 특히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를 확장하려 한다. 파슨스는 사회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를 설명하려 했다면, 카프는 그 안정성 속에 숨겨진 공격성의 역할을 드러내고자 한다. 하버마스가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조했다면, 카프는 생활세계 속의 무의식적 공격성과 권력의 작동을 분석한다.
카프는 아도르노의 비판적 개념들을 '체계화'하면서 그 해방적 내용을 제거한다. 아도르노에게 전문용어는 자본주의적 물화의 징후였고,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했다. 그러나 카프는 이를 심리학적이고 초시간적인 현상으로 환원한다. 공격성은 역사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충동이 된다.
이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카프가 나중에 만들게 될 Palantir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가 본질적으로 억압된 공격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리고 그 공격성이 전문용어와 같은 '은폐된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카프의 논문 어딘가에는 이미 Palantir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던 것이다.
Palantir Technologies
2003년, 카프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실리콘밸리로 돌아온다. 스탠포드에서 함께 법학을 공부했던 피터 틸이 그를 찾았다. 틸은 페이팔을 매각한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보기관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CEO로 카프를 원했다.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윤리적 문제를 깊이 사유하는 능력. 이것이 기술 회사의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었다.회사 이름 자체가 철학적 자각을 드러낸다. Palantir는『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보는 돌'(Seeing Stones)에서 따왔다. 이 수정구는 멀리 떨어진 곳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사용자를 타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구다.

사루만은 팔란티어를 사용하다가 결국 사우론에 의해 타락했다. 하지만 간달프는 같은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했다. 즉 팔란티어의 창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기술의 양면성을 처음부터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강력한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이 본 적 없는 것을. 그래서 회사 이름 자체를 경고로 삼았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후대가 Palantir를 악용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실제로 Palantir는 창립 초기부터 Privacy and Civil Liberties Engineering Team을 만들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기술 업계에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의 일이다. 감사 기록을 삭제할 수 없게 만들고, 데이터 접근에 대한 투명한 정책을 수립했다.
Between the Habermasian ideal and Palantir's reality
여기서 근본적인 역설이 드러난다.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를 공부한 카프가, 체계의 논리를 극대화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배운 철학자가, 전략적 합리성의 도구를 개발했다는 것.
하버마스에게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극복해야 할 병리였다. 그는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민주적 과정을 강조했다. 이상적 대화 상황에서는 권력의 강제 없이, 오직 '더 나은 논증의 강요 없는 강제력'만이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팔란티어가 하는 일은 정반대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숨겨진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CIA, FBI, NSA,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이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이다. 테러리스트 추적, 범죄 수사, 국경 통제. 팔란티어는 국가 권력의 감시 능력을 극대화한다. 하버마스가 비판했던 '체계의 생활세계 식민화'를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카프는 이를 정반대로 본다. 그에게 팔란티어는 오히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도구다. 2022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아이디어와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구현된 아이디어와 말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박사논문의 테제를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카프는 전문용어(Jargon)가 진정한 의미를 은폐하고 권력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데이터를 통해 실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논문에서 그는 이미 암시했다:
"행위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 가지 질문에 따라 인지적·정서적 의미로 판단된다: '이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바로 이 두 질문에 답하려 한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분석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카프가 보기에, 이것은 '전문용어의 독재'를 깨뜨리고 진실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War and technology: Lessons from Ukraine
카프의 철학적 입장이 가장 명확히 드러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다. 2022년 6월, 카프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최초의 서방 주요 기업 CEO가 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그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적 우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프의 논리는 이렇다. 전쟁은 불가피하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쟁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다. 기술은 전쟁을 더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군사 목표만을 타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2025년 저술한 『The Technological Republic: Hard Power, Soft Belief, and the Future of the West』에서 카프는 이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한다. 그는 실리콘밸리가 '윤리적 나약함'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기술을 무기화하는 동안, 서방의 기술 기업들은 '도덕적 자기검열'에 빠져 국방과 안보 분야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방의 삶의 방식이 우월하다는 일관된 친서방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열망에 부응할 때 그렇다."
이것은 하버마스가 경계했던 문화적 제국주의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카프에게 이것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헌신이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이것들은 문화 상대주의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확산시켜야 할 가치다.
Failure of "Don't Be Evil"
카프의 비판은 실리콘밸리의 위선으로 향한다. 특히 Google의 모토 "Don't be evil"을 정면으로 공격한다.
"'악해지지 말자'같은 기업 슬로건의 얕고 가리어진 허무주의를 보라. 이것은 전문용어의 완벽한 예시다. 겉으로는 도덕적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 '악'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실제 윤리적 고민을 회피한다."
카프가 보기에, Google 같은 회사들은 "악해지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용자의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행동을 조작한다. 이것이야말로 아도르노가 비판한 '전문용어'의 전형이다. 진정한 윤리적 헌신 없이, 표면적인 도덕성만을 내세우는 것.
반면 팔란티어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히 했다. 국가 안보와 국방. 테러와 범죄와의 전쟁. 동맹국 지원. 카프는 이것이 더 정직하다고 본다. 위선적인 도덕성보다 투명한 현실주의가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버마스가 경고했던 것처럼,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를 침투할 때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위협받는다. 팔란티어가 아무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해도, 그것이 만드는 감시 인프라는 오용될 수 있다. 카프 자신이 회사 이름을 통해 인정했듯이, 같은 도구가 간달프의 손에서는 구원이 되지만 사루만의 손에서는 저주가 된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한다. 21세기 기술 사회에서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장과 행정의 효율성 논리가 전부가 아니다. 인간은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다. 공론장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카프는 다른 진단을 내린다.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해서 전통적인 의사소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합리성이다. 카프는 이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버마스가 경계했던 '기술관료적 의식'의 변형이다.하버마스는 1968년 저서 『기술과 과학을 이데올로기로서』(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에서 이미 이 문제를 예견했다.
기술적 합리성이 스스로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한 권력 관계와 지배 구조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중립적이지 않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는 권력이 작동한다. 팔란티어의 경우, 누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가? 누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가? 어떤 패턴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분류되는가? 이 모든 것은 정치적·사회적 결정이다. 하지만 기술의 객관성이라는 외피를 쓰면, 이러한 결정들이 마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인다.
카프가 의도했든 아니든, 팔란티어는 하버마스가 경고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디지털 시대에 재현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감시 자본주의, 알고리즘적 통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적 상호작용에 체계의 논리를 침투시킨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을 상품화한다. 우리의 친구 관계, 가족 대화, 정치적 토론이 모두 데이터로 수집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되고, 광고주에게 판매된다. 이것이 바로 하버마스가 말한 '화폐화'와 '법률화'의 현대적 형태다.
더 나아가, 감시 기술은 우리의 행동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이 극단적인 예시지만, 서방 국가들도 다르지 않다. 신용 점수, 범죄 예측 알고리즘, 채용 AI.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분류되고, 통제된다.하버마스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전략적 행위'가 '의사소통 행위'를 대체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행동을 한다. 좋아요를 받기 위해, 추천 시스템에 노출되기 위해,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생활세계와 체계, 의사소통과 감시, 자유와 안보. 이 모든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의사소통 행위의 이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화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설령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 위르겐 하버마스